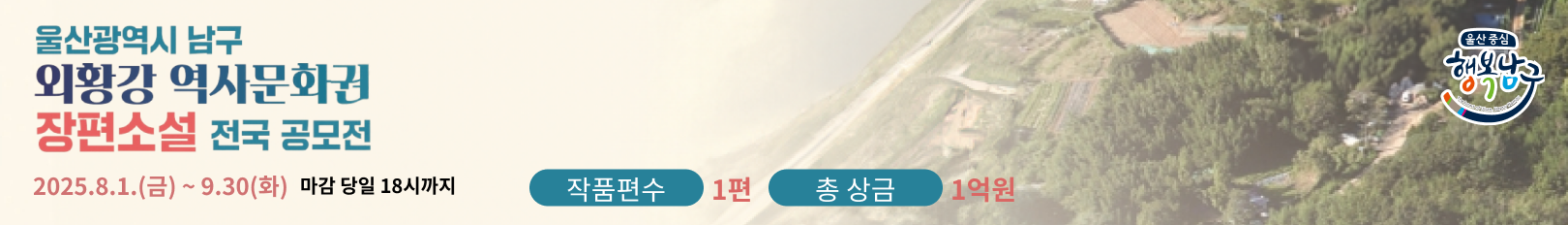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1월 671호
58
0
요즘 세대에 가문의 가훈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 가훈은 ‘직방재’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교 경전에 나오는 구절로, 직역하면 ‘안과 밖을 곧고 바르게 하라’는 말이다. 자손에게 아침저녁으로 자신의 몸가짐과 언행을 성찰하며 살라며 전한 증조부의 유훈이다.
조선 말엽의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수당(修堂) 정종엽(鄭鍾燁) 선생께서 이 글귀를 석촌 윤용구 서예가에게 부탁하여 후손에게 전하며 글씨로만 보관해 왔다. 증손인 정동희의 선친(운당 정상염)께서 조부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부탁했다. “꼭 한옥으로 지어라”라고.
선친의 유훈을 저버리지 않고 새기고 있다가, 공직에서 정년퇴직하면서부터 2년여를 매달려 수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直方齋>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이날따라 아침에 살짝 내린 눈에 그 위엄을 더해 주었다. ‘直方齋’를 목판에 조각하여 편액을 제작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정면 4칸에 측변 2칸, 누대 1칸의 겹치마 팔작지붕으로 한쪽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의 평면 구조로 지어졌다. 내 외부를 살펴보니 대목장부터 각 부분의 전문가들의 솜씨가 어우러진 걸작이었다. 더욱이 서예를 배워가며 행초서로 훈계의 글인 <直方齋 箴> 200자와 협서 18자를 직접 쓴 그 정신은 서예에 몸담은 내가 찔끔했다. 그 조상 그 후손으로 현대판 효손이 아닌가.
어린 시절 내 선친께서는 입춘 날이면 동네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였다. 종이 한 장 살 수 없는 가난에 어떻게 구했는지 문짝을 바를 때 쓰던 창호지 조각을 들고 와 내민다. 우리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리 갈고 저리 돌려 갈다가 손잡기도 어려운 삼각 김밥 같은 먹을 갈아 지방이나 쓰는 세필로 입춘첩을 써주었다. 1년 내내 가족이 무병장수하고 가화만사성하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 넉넉한 집은 여러 장 써갔지만, 몇몇은 대문에 붙이는 달랑 ‘立春大吉 建陽多慶’만 들고 갈 뿐. 그때 입춘첩을 써주시던 선친의 모습에서 묵향이 배었는지 퇴직 후에 붓과 친구가 되었다. 이제 십수 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미처 깨치지 못한 게 한두 가지던가. 어렵지만 배울수록 오묘한 것이 붓놀림이다.
또 하나,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훈은 ‘정직과 검소’였다. 바로 ‘직방재’와 같은 가르침이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나 큰 잘못이었을까? 노부모의 외아들임에도 벼락천불이다. 작대기를 들 때도 있었다. 혼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에 “앞집 천가 놈처럼 되려는 것이냐?”는 필수 훈계였다. ‘도대체 천가 놈은 어떤 사람인데 저러실까?’라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럴 만했다. 천가라는 사람도 노부모의 외아들인데 노부모의 바람과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으로 속 깨나 태우는 형이었다. 선친은 ‘직방재’를 어린 내게 명문이 아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부모 제사도 지내지 않으려는 요즘 세상에서 흔치 않은 일이기에 참석자 모두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행사장에는 증손의 자녀 외에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농촌에 살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행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주중에 인근 학교와 연락하여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행사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싶었다. 도덕적 윤리가 퇴색해지는 요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요즘 부자 간이나 형제 간 또는 이웃 간에 얼마나 소통하며 존중하고 사는지 돌아볼 일이 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자녀들만이라도 ‘직방재’의 유훈을 이어받아, 곧고 바르며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예뻐 보였다.
초임지에서 만난 정동희의 선친은 명절 때나 제사를 지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초대해 줬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 가양주와 음식에서 학자 집안이라는 가풍이 물씬 풍기곤 했다. 그러면서도 조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나, 진안에서는 정학자로 정평이 나있었다. 증손과는 반백 년이 넘은 인연이지만, 지금까지 찾아주는 마음이 ‘직방재’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다.
한학에 일천한 주제에 ‘직방재’와 같은 구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재를 고를 때마다 고생하는데 알찬 수확을 했다. 제자에게서 인생의 한 수를 배웠고, 인생의 늦가을이지만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평소 예의 바르기로 평판이 자자했던 제자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어깨를 토닥거리며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내 사후 공간에 어떤 글귀가 자리할까 돌아보았다. <直方齋> 현판식을 계기로 동래정씨 가문에 직방재의 유훈이 길이 전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주위에도 전파되어 퇴색해 가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실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