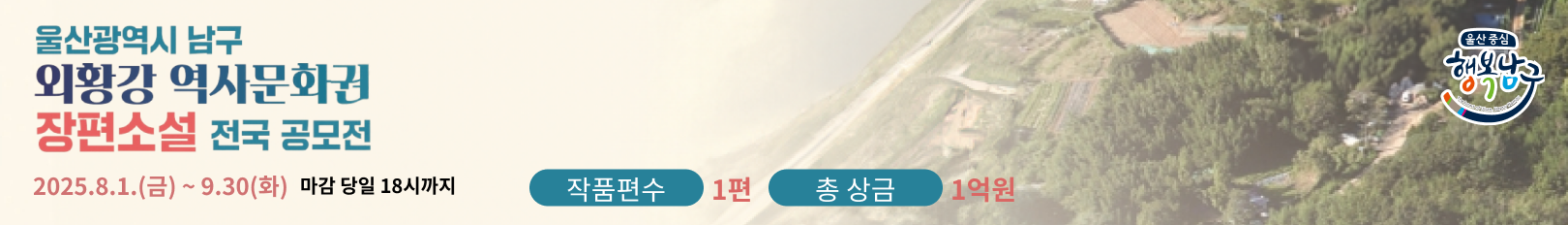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2월 672호
65
0
우리 집 애완조(愛玩鳥)가 죽었다. 도서관 수업을 듣고 돌아오니 햇빛을 향해 날개 한쪽을 쭉 펼치고 있기에 일광욕하는 줄 알았다. 잠시 뒤 돌아보니 두 발을 하늘로 향하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새가 저렇게 누워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상하여 달려가 보니 새는 미동 없이 눈을 감고 있다. 나는 얼른 꺼내 손안에 올려놓고 심장을 마사지해 주었다. ‘째…’하고 여리고 작은 소리를 냈다. 어쩌면 소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동안 볼록한 가슴을 문질렀다. 그러나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새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미 조짐은 있었다. 올해 들어 부쩍 조는 것처럼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이 흔들렸다. 며칠 전에는 해바라기씨를 먹다 말고 휘청해서 먹이통에 고꾸라지는 줄 알았다. 모란앵무새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니까 열세 살 우리 새도 고령인지라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졸다가도 또 괜찮아지곤 했기에 오늘이 그날일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애완조의 이름은 허새이다. ‘허씨 집안의 새’라는 뜻으로 아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허새는 친정 동생이 키우던 앵무새가 두 번째로 낳은 알을 직접 부화기에서 부화시키고 주사기로 분유를 먹여 키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기 전 이름이 ‘2호’였다. 툭하면 발로 새장 문을 들어 올리고 나와서 날아다니곤 했는데 그만큼 자유롭게 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윙컷을 해주어야 했다. 윙컷이란 날개의 가장 바깥쪽 큰 깃털 두세 개를 반 정도 잘라주어 너무 높이 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장을 탈출하면 동백나무에 앉기도 하고, 액자나 텔레비전 가장자리에 올라앉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허새가 가장 좋아했던 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내 어깨에 날아와 앉는 것이었다. 베란다에서 부엌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고 사람을 무척 좋아했으니까. 어깨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말똥말똥 쳐다보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곤 했다. 모란앵무는 작아서 그런지 말을 따라 하지는 못했다. 국수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국수를 잘라 줄 때마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도는 게 유일한 개인기였다.
어느 날 아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와 동시에 허새의 자유는 거의 사라졌다. 물론 허새는 터줏대감이었고 어린 고양이에게 한 치도 밀리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새장의 문을 열리지 않게 잡도리해둘 필요는 있었다.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새를 잡아 죽인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방에서 잠든 다음 닫힌 방문을 확인한 후에 가끔 허새를 꺼내주긴 했으나 그나마도 시나브로 횟수가 줄어갔다. 안타까웠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허새는 자유를 잃어 갔다. 그즈음에 나도 가슴에 돌 하나를 얹은 듯 답답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필가로 등단하고 몇 년,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좀처럼 글이 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이 곧 그 사람이다, 좋은 글을 쓰려면 먼저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잘 쓰는 것도 그렇지만 잘 사는 일은 그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될 일이던가. 단지 생각만 담아두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어쨌거나 매달 지역 신문에 연재하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든 쓰긴 써야 했다. 궁여지책으로 훌륭한 작가의 좋은 글을 모방하여 그 틀에 내 생각을 꿰어 맞춰 그럴듯하게 얼개 짜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괜찮은 글이 써졌다. 좋은 글 먼저 쓰고, 나중에 그 글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순서가 뒤바뀐들 무슨 상관일까 싶었다. 마음 밑바닥에 의심의 한 자락이 깔려 있었지만 좋은 글도 쓰고 내 삶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했으므로 편하게 안주했다. 견고하게 나를 지켜 준다고 믿었던 새장에 마음이 갇히게 되는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날던 기억을 잃어 갔다.
언젠가 글은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커서가 껌뻑거리는 모니터 빈 화면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허새와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새장 속이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강제로 방 안에 가두고 새장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지만 정작 허새는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날던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 안전한 새장 안에서 편하게 주는 먹이만 먹는 생활에 안주하게 된 것일까. 씁쓸하게 새장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다. 허새가 푸드덕 날아준다면 꽉 막혔던 내 글의 물꼬도 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내 글이 머릿속에 갇혀버린 것이 허새 때문이라고 애먼 탓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차갑게 식어버린 허새의 몸을 깨끗한 종이로 감쌌다. 좋아하던 국수와 해바라기씨와 좁쌀과 함께 벚나무 아래 묻어 주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옆에 와서 야옹대는 고양이 먼저 챙기느라 더러 서운하게 했다면 부디 용서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훨훨 맘껏 날길 바란다.
앵무새를 보내며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 것 같다. 모자라고 서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만의 글을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미화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써볼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역시 누군가의 어떤 삶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슴슴하게 살아봐도 괜찮을 듯싶다. 소박하게 기본에만 정성을 다하면 화려한 맛은 없어도 마지막까지 질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