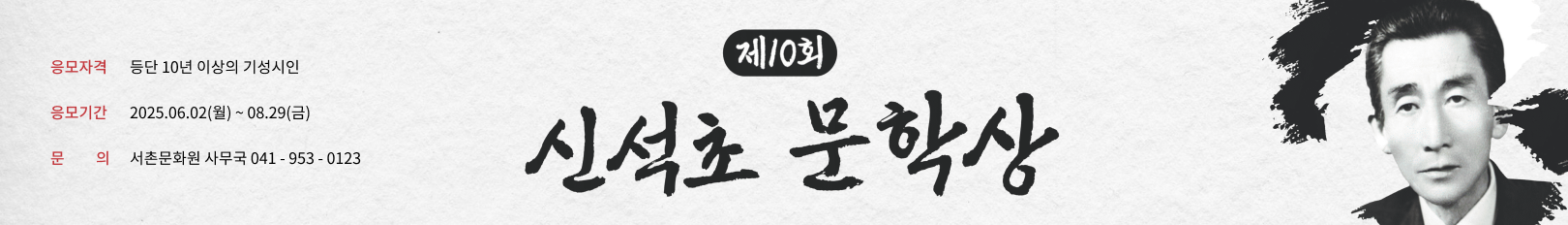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2월 672호
70
0
비가 온다. 온통 녹색 하늘이던 마당 위에 그리움을 잡아먹는 소낙비 내려, 꽁치 한 마리 은박지에 돌돌 말아 봄부터 잠자던 난로를 깨워 불을 지피고 막걸리 한 잔을 입에 넣고 꽁치 비릿한 내음으로 안주 삼아 기억의 강을 곱씹어 본다.
어느 마을이든 초입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우린 성황당 나무라 부르고 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당연히 언제나 딱 한 그루씩이다. 고향 안동을 등지고 소백산 희방사 골짜기를 넘어 두 번째로 살던 보금자리 잡은 곳이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 근처 잊고 싶었던 곳이라 정확한 마을 지명이 생각나지 않는다. 면소재지에서 두 시간쯤 종종걸음으로 들어간 강원도 쪽으로 향한 소백산 처음이거나 끝으로 기억된다.
그때가 7살쯤이었을까.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7월 어느 날이었다. 우르르 쾅쾅, 산을 흔들 만큼 큰 소리와 함께 따라온 빗줄기는 얼마나 세찬지 가녀린 우산대가 파르르 떨며 앞길을 막아섰지.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자욱한 안개꽃이 생길 정도였다. 천둥번개 칠 때면 나무 밑에 가지 말라는 말은 그저 과학일 뿐 나의 대피소는 마을 입구에 떡하니 버티는 세월 가늠하기 힘든 커다란 성황당 나무 밑뿐이었다. 그곳은 따가운 여름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님들 쉼터요, 서러움 가득한 어느 집 맏며느리 푸념 장소요, 앞집 총각 뒷집 순이 짧은 호흡 긴 여운 남기는 오묘한 장소이기도 한 곳이다. 때로는 약초꾼 영칠이 아버지 검은 얼굴 식히는 사랑방이 되기도 하는 곳이다.
들판을 난도질하는 비는 그치지 않고 햇볕 한 줌 들어올 수 없는 성황당 나무를 뚫고 나온 빗방울은, 눈깔사탕만큼 커져 머리를 탕탕 치고 있었다. 책가방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자동으로 머리 위에 올려졌다. 숙제 못해 교실 복도에서 벌 받는 아이마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에게 텔레파시 보내는 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다면 간단한 일이지만 어디 그 시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각 마을마다 까만 손전화기 한 대 겨우 있던 시절인데….
“아, 아∼ 그러니까 막둥이 아버지 전화 왔어 어디여?” 하는 방송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일손 멈추고 귀 쫑긋 하던 구름 속 날이었는데…. 암튼 그랬지. 끔뻑끔뻑 두꺼비마냥 쪼그려 간절히 기도하며 오지 않을 우산을 서럽게 기다렸지.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까! 마을 어귀 지랄맞던 똥개도 자기 집 찾아 갔을 것이고 넓은 들마루에 앉아 양반 흉내 내던 꼴통 할배도 미닫이 티비 앞에서 헛기침할 시간인데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우웅우웅,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도깨비 소리 같은 무서운 새 소리가 나를 점점 쪼그라들게 만들어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그때 먼발치에서 한쪽 손엔 호미 한 자루 나머지 한쪽은 검은 비닐 봉지, 머리 위엔 흙 묻은 수건 달랑 걸쳐 있는 엄마가 온다.
“우와 엄마다!”
나의 엄마다! 비 많이 와 빨리 와, 외치는 나의 아지랑이 외침에 엄마도 뛰고 나도 종종 제자리로 뛰었다. 드디어 엄마가 오시는 것이다. 고랑진 흙탕길 사이로 짧은 다리 총총거림이 황새다리처럼 길어 보인다. 나는 가방을 등으로 순간 이동하여 송아지 일 갔다 돌아온 어미소 반기듯 팔딱팔딱 뛰어갔다. 엄마도 얼마나 반가운지 빗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는다. 나도 덩달아 빗물을 마셔 보았다. 천하의 꿀물도 이보다 달짝지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엄마의 검은 봉지 속 오이, 토마토도 흥겨워 춤을 춘다. 그날 저녁 밥상엔 얼음 없지만 살짝 매운 고추가 들어간 시원한 오이 냉국에 사카린 들어간 토마토를 후식으로 소반 가득 채워 둘만의 만찬을 즐겼다.
올해는 유난히 가을비가 많이 내린다. 비만 오면 쓸쓸해하는 나를 위해 나의 나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김치부침을 한다. 나는 변함없이 부침이 익기 전 엄마 엄마 주름을 마신다. 비만 오면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화롯불에 올려 허멀건 밀가루 반죽을 굽던 모습이 부엌에 걸린다. 가을 하늘에 걸린 오막살이 추녀에 걸린 방울처럼 미친 듯 그립다. 있을 때 잘할 걸 후회가 고독의 빗물로 바닥에 웅덩이로 있다 고독으로 흐른다.
‘보고 싶다 엄마. 거기는 따뜻해? 난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 시리게 추워.’
천년의 고목으로 살기보다 잘리고 부러져도 다시 피어나는 대나무의 잎으로 살게 해준 나의 꽃 죽순 같은 그리움은 내가 섬이 아니라 당신이 섬이라는 진실이 나도 바보지만 따라가는 시간이 참 좋아 바보 같은 엄마를 따라가는 바보의 고백 늦었지만 말해도 되지?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그 후 다른 두 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데 겹겹이 만리장성이다. 나는 여기서 숨 쉬고 엄마는 높은 곳에서 쉼한다는 사실은 서러움보다 미안함이 가득하다. 엄마가 태어나 이루어낸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내가 유목민인 게 지금 행복해.
‘하늘가 구름 위 사랑해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