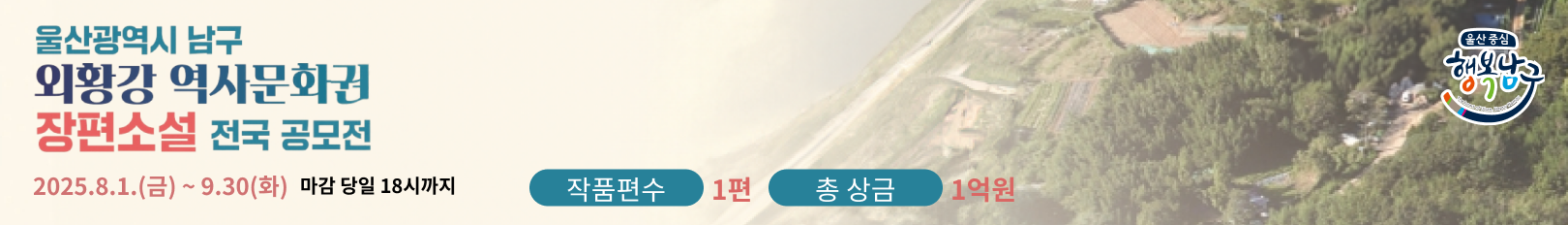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2월 672호
62
0
나는 전망이 있는 삶을 좋아한다. 전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전망이 있는 집을 찾아다녔다. 몇 번의 이사 끝에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둥지를 틀었다. 창을 열면 백운산을 물들인 여명이 도시의 끝자락 너머 서해의 노을로 눕곤 했다. 겨울 햇살은 거실 깊이 들어와 오수를 즐겼다. 눈앞엔 긴 몸을 드리운 수리산이 철따라 옷을 갈아입었다. 잉어가 뛰노는 안양천 변에 늘어선 나무들의 우듬지에선 백로들이 군무를 췄다.
이런 풍경도 잠시,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자연의 스카이라인을 끊어 먹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은 건너편 아파트 창에 부딪혀 인공의 빛으로 되돌아왔고, 일몰은 마천루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허둥거렸다. 수리산은 겨우 무릎 정도만 남았고, 안양천의 맑은 수면도 거대한 아파트 그림자가 점령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방이 위풍당당한 아파트 군단으로 포위되었고 전망의 잔해만 남았다.
전망은 풍경을 부르지만 단순히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전망이 있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민머리 학생 두 명이 남한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12년 교화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TV에 소개됐다.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검열 당했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이어졌다. 갈망은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강렬한 특징인데, 북한 청소년들이 K-POP과 같은 남한의 문화를 얼마나 동경할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유난히 유행을 타는 초등학생들의 꿈은 요리사, 유튜버, 운동선수를 넘나들고 있다. 중·고생의 경우 부동의 1위는 몇 년째 교사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통해 영감을 받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다르게 보면 그만큼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꿈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꿈이 주로 직장에 맞춰져 있어서 하고 싶은 일과 정작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 입에서 건물주나 돈 많은 백수라는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삶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관점과, 노동 없이 편한 삶을 추구하는 인식이 만들어낸 문화현상으로 보인다. 노동당 위에 장마당이 있다고 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보듯, 한 나라의 혼은 특권층이 아니라 소박한 사람들의 생활에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평범한 대중이 만들어가는 가치는 그 나라의 전망과 연결되어 미래를 결정하기에 이런 현상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전망이 있다는 것은 앞이 트였다는 의미다. 앞이 트였다는 것은 앞길이 훤하다는 것과도 같다. 소백산 700고지 민박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아 자주 찾곤 했다. 거기에선 꿈도 예쁘게 꾸었다. 몇 년 전 그 앞에 족욕 카페가 들어섰다. 국립공원 내 이토록 비좁고 호젓한 땅에 어떻게 저토록 거대하고 바빠 보이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였다. 카페는 밤새 호수에서 피어올라 아침이면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안개의 길을 막아버렸다. 굽이치는 산허리도 검은 카페의 직각 모서리에 맞아 끊어졌다. 정자의 처마 끝에서 산바람 소리를 타던 풍경(風磬)도 사라지고 내 발길도 점차 뜸해졌다.
유일하게 6·25전쟁 중에 건축된 속초 동명동 성당이 우후죽순 격으로 세워지는 고층 건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성당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자 우람한 아파트가 배경으로 들어찼다. 유일하게 남은 해 뜨는 길마저 아파트가 막아선다면 성당의 전망은 그야말로 콘크리트 감옥에 갇힌 꼴이 될 것이다. 이토록 발달한 시대에도 국가등록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전망을 지키는 힘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오래된 유산이나 예쁘고 귀한 전통은 오늘 지키지 않으면 내일 지키기는 더 어렵다. 오늘이 결락된 자리에 내일이 들어설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전망도 그렇다. 뜻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성당 옆으로 난 바닷길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전망이 풍경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전망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된다.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는 북한 아이들에게서 전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록 뼈저리게 가난했지만, 남한 아이들에게는 그나마 자유가 허용되었기에 자신들의 전망을 찾아갈 수 있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명예를 드높이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소박한 시민으로서 위기 때마다 함께 모였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전망을 선사해야 할 것인가. 북한 아이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며 전망의 부재 속에 갇혀 있다면, 남한 아이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질의 거탑에 갇혀 있다. 창가에 앉아 전망의 잔해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과연 전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본다. 전망은 한 아이의 정서적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균형감각을 일깨우기에, 이제부터라도 변화와 성장의 뒷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전망의 문제를 광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토양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을 넘어 마침내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고 본다. 이런 기회에 전망의 문제 또한 곁들여 풀어나가는 것은 어떨까.
마흔 줄에 들어선 자식을 가리켜, 어려서부터 숫자와 글자만 보고 자란 아이가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한탄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다. 만약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좋은 음악, 좋은 그림,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 이런 마음은 아이들의,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할 것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철학과 시스템도 아이들의 꿈과 일이 일치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니, 어른들의 삶이 아이들에게 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삼가고 또 삼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