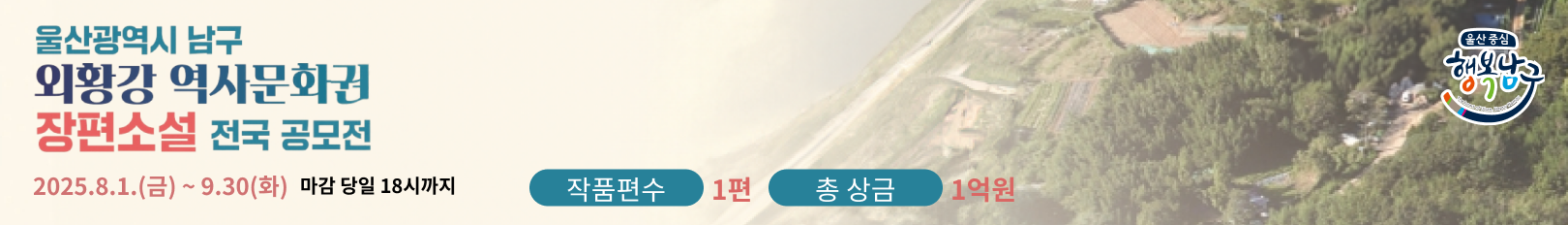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35
0
무심코 포로처럼 걸어두었을 희망사진관.
나에게 들리던 희원(希願)의 목소리가 커지던 날
닷새에 한 번, 제법 오래 전에 친구가 되었다.
덩그러니 넉살 좋은 욕심도 모른 채
나처럼 양손을 모으고 서 있는 직사각형 사진관 간판.
손님이 마음먹고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 집 주인 사진사가 나오는 출구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비밀만큼 버려진 듯한 얼굴 모양 사운댄다.
연한 청담색 윗도리에 그려 놓은 글씨는 하얀색 이빨을 드러내고
문득 떠오르는 와이셔츠빛이다.
혼자 떠돌아 댕기는 색소폰 빛깔 그을린 거리의 악사처럼 휘청거린다.
긴 한숨 길게도 듣다 보니 철모를 제트기 소리 장단에 휘돌리던 시절.
나락의 먼발치에서 렌즈를 맞추어 훔쳐보면 사진관 앞에 장이 열린다.
아직도 그 허름한 간판에 묻은 파란 하늘을 눈여겨보는 손님은 별로 없다.
주인을 기다리는 똥강아지 한 마리 덮고 있는 겨울 이불을 공연히 나그네의 바람이 건드린다.
우린 금방 홑겹의 옷을 입고
몇 꺼풀 인연의 외투를 벗어 던지며
도적처럼 지나가서 과거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서늘하게 장이 서지 않는 날
파도처럼 몰려온 절대 고독에 굴러
멍이 드는 내 동무는 하루 종일 바다를 훔쳐보다
허옇게 얼룩이 져서 한 길 물속 모자반 수풀 속으로 쓸리어 간다.
그래서 친구에겐 그 바다의 향기, 방풍화 꽃냄새가 난다.
그래, 희망사진관, 너밖에 없다.
오늘 저기 식당에 가서 순대국밥이나 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