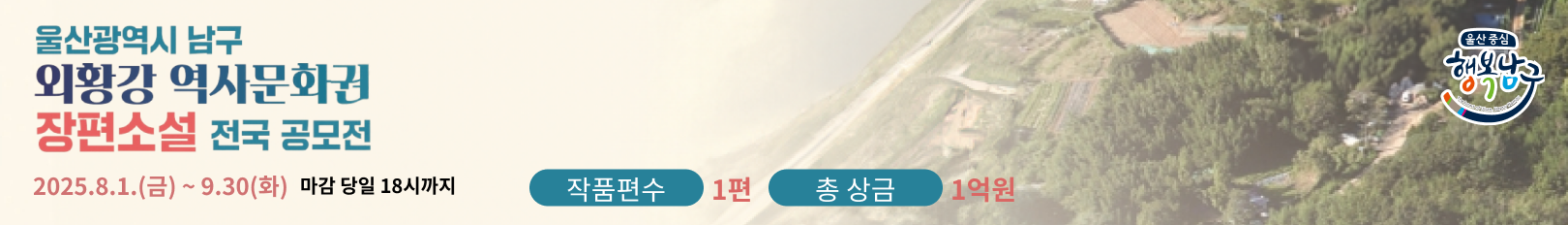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50
0
아득한 세상
산허리를 감싸는 안개
해 뜨면 스르르 몸을 거두는
나는 이슬이었다
해 뜨면 스러질 찰나의 목숨
세상 풍광, 인간 세상 떠돌다가
고목의 가지에 일렁이는 꽃들의 절정에서
풀밭을 기며 들꽃을 피우는 가녀린 꽃들에게서 바람이었다
냉랭한 대기에서 침엽수의 가느단 바늘 끝 잎에 매달려
쏴아쏴아 흐느끼는 바람
어질고 순한 눈빛을 들여다보고 그들과 마주한 눈빛
아∼ 나는 방랑자
더 무엇을 바라랴
이슬과 안개와 바람은 나였고 어진 눈빛의 뭇짐승은
덩달아 사랑으로 차오르는 따뜻함이 번지는 허공
나는 허공이었다
종횡무진 허공이었다
적자생존의 비애에 후다닥 외면하는
정글의 법칙에 맞설 수 없어 도주를 일삼고
나는 그저 꽃그늘만 찾아
보고 싶은 것만 애착하는 허공
영혼의 표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