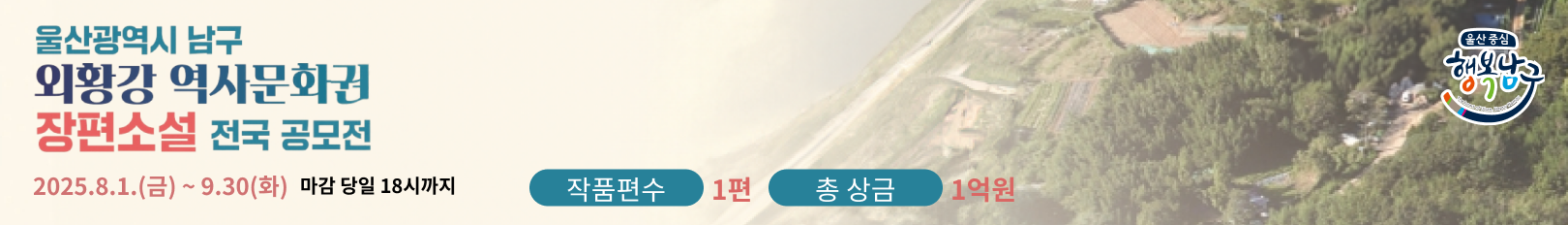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47
0
땅속 노랗게 기척을 감췄던 계절이
쇠붓털 같았던 산의 능선을 타고
소리도 없이 계곡 물가에도 가지를 뻗는다
어느 봄날
우물가 한가득 넘치던 한 바구니의 웃음소리들처럼
어느 계절 한 자락 따뜻하던 얼굴들이
창을 열면 보란 듯 시절 내내 노란 손 흔들어오던 기억들
종일 모니터에 두 눈을 팔고 살다 모처럼 밖으로 나서는 날엔
노란 봄기운이 지친 눈가를 쓸어주듯
바람을 타고 하늘거리곤 했었다
지붕 위에 풍성해진 머리와 팔뚝을 얹고
종일 창밖에 서 손을 흔들던 것도 모른 채로
알 듯 모를 듯한 하루와 화면 속에 빠져
무딘 일상으로 견디어 온 시절들이 부끄러울 만큼
다시 봄날
계절은 눈으로 몸으로 꽃눈을 틔우고
산수유 노란 빛은
지난 기억들의 아득해진 눈빛만큼이나
밝고 따스해진 햇살들을 마중하고 섰을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