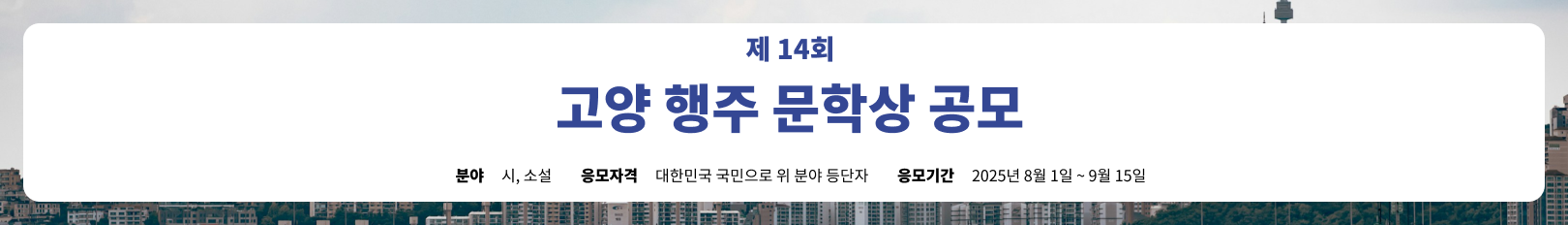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83
0
오늘 저녁, 할머니의 파제(罷祭)와 함께 헤어져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일 년에 단 한 번이지만 지팡이를 통해 할머니의 숨결과 함께 어렸을 적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마음이며 손길을 다소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젠 이마저 맘매로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사실 할머니 제사 주제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참사(參祀)한 가족들은 모두 한마디씩 구시렁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주제하실 때는 구경도 할 수 없던 물건들이 제상에 진설되어 있어서이다.
제사를 모시는데 고무신은 어인 물건이고, 지팡이는 또 웬 뚱딴지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위패 한쪽에는 고무신을 놓고, 다른 쪽에는 지팡이를 세워 두고 제사를 모시려 작정하는 행동이 이치에 영 맞지 않을뿐더러 황당하다고 했다.
고인의 유품이면 진작 보내드려야 당연하거늘 어디다 간수했다가 새삼스레 제상에 올리느냐는 것이다.
고인의 아들이 제사를 모실 때와 손자가 모실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제주(祭主)가 누구냐는 사실만 강조하고 그 사연은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분위기를 다스렸다.
다음 해의 제사를 모시는 제상에도 유품은 어김없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 유품에는 변화가 없었고 위치 또한 그대로였다.
그 새에 고무신은 시나브로 삭으면서 운두만 남는 바람에 소지(燒紙)와 함께 보내드렸지만 지팡이는 아직 튼튼했다.
만일 할머니가 회생하신다면 다시 짚기에 넉넉하리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죽부인(竹夫人)과 함께 지팡이는 후대에 물리지 않는다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치에 맞고 정서와 일치해서 군소리는 없다.
청상으로 일생을 보낸 할머니에게 죽부인은 무관하지만 지팡이는 이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시대라면 할머니는 조장(朝杖)을 받아야 할 연세였지만 이를 8년이나 넘기고 나서야 손자에게 받은 가장(家杖)인 셈이다.
가족들의 염원대로라면 제상에 오르지 않아야 당연하다.
그러나 유품에 마음이 담겨 있고 제주가 직접 쓰지도 않으니 고스란히 간직해 두었다가 일 년에 단 한 차례 제상에 오를 뿐이니 그게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는 마음이 구름 같아서 그랬던 것이다.
할머니가 생존하셨을 때의 어느 날이다.
내가 사 드린 하얀 고무신은 쉽게 찾아 신었는데 두 손을 휘젓고 앞을 더듬으며 갈팡질팡하셨다.
어떻게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가에 놀라며 지팡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팡이라면 흔히 청려장(靑藜杖)이라 하여 명아주를 첫째로 치고 실제로 이것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다.
명아주는 한해살이풀인데 이걸로 만든다고 하니 단명(短命)을 부추기는 느낌이 들고, 수명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어느 정도나 튼튼한가도 마찬가지였다.
가볍기야 하겠지만 이걸 믿고 몸을 의지했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 아니 난처할 일이 아니겠는가.
눈이 밝으면 돌부리 가리고 웅덩이 피할 수 있으니 가벼워서 좋겠지만 늘 어둠 속을 헤매야 하는 할머니에게는 마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천년을 산다는 은행나무였다.
행자목(杏子木)은 구하기 쉽고 단단할뿐더러 변형이 없으며 해충 또한 덤비지 않고, 따라서 쉽게 썩지 않으니 이만한 재료가 어디 있으며 일 년밖에 살지 않는 명아주와 감히 비교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닿자 마음이 급했다.
여기 쓸 정도의 행자목을 구하기는 쉽다.
내 손으로 깎고 다듬는 손질에, 청상 시절 머릿기름에 늘 쓰셨다는 동백기름을 스미게 해서 할머니의 체격에 맞췄다.
얼마 전에 사 드린 하얀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자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득 채웠다.
근래에 보기 드문 흐뭇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 웃음 속에서 할머니의 행복을 읽었고, 어렸을 적 베푼 따뜻하면서 크고 작은 은혜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생계가 어렵대서 중학교 진학으로 선뜻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망설이기를 거듭하는 아버지를 나무라고, 학용품이 없어 아침마다 징징거리는 손자의 눈물바람을 나 몰라라 하는 어머니에게 타박을 주어 오늘에 이르는 바탕을 만들었다.
마을에서 잔치라도 있는 날이면 할머니는 당신의 콧물을 훔치던 손수건에 이런저런 음식을 잔뜩 싸서 품속에 넣어 두었다가 고스란히 내주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게 해 주었다.
이것 하나로 할머니의 은혜를 하마 모조리 갚을 수 있을까.
제상에 올려놓은 이 유품은 할머니가 주는 힘이자 용기였다.
그러나 세월은 너무 철저하고 빈틈이 조금도 없었다.
더 이상의 너그러움이나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도 많이 변했다.
이젠 할머니를, 얼굴을 모르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선조들의 곁으로 보내 드리라고 거듭해서 재촉한다.
선산에서 모시는 시향으로 옮기자는 가족들의 성화가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전날과 많아 달라지고 보니 끝끝내 고집을 부린다거나 천단하기가 여간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작정하니 걱정 하나가 생겼다.
지팡이가 설 곳이 마땅찮게 되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었다고 해서 선산에 안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할머니의 마음이 거기 배어 있다고 믿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 기어이 주인 곁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애당초 두 유품을 챙긴 까닭이 있다.
이걸 내가 마련해 드렸다는 생색 따위는 전혀 아니다.
순전히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할머니를 유택에 모시는 산역을 끝내자 마지막으로 유품도 함께 보내드린다면서 잡동사니를, 유택 부근에 동실하게 쌓더니 거기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얼른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다.
하얀 고무신과 지팡이였다.
잽싸게 그 두 가지를 따로 챙겼다.
그리고는 새로 마련한 유택을 두고 약속했다.
‘할머니의 제사는 반드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팡이를 드렸을 때 환하게 웃으시던 갸름한 얼굴을, 새 고무신을 드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쥐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지팡이를 할머니 곁으로 보낸다는 것은 할머니가 내 곁에서 아주 떠나게 된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곧 무너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파제 뒤 소지하는 김에 지팡이서껀 함께 불을 붙이면서 빌었다.
‘그 사이 소원해 마지않던 할아버지 곁에서 함께 영생과 복락을 한꺼번에 누리시며 저를 지켜보세요.’
유난히 맑은 밤하늘 속으로 가느다랗게 하늘거리며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평소 늘 즐기시던 소복차림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아스라하게 멀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