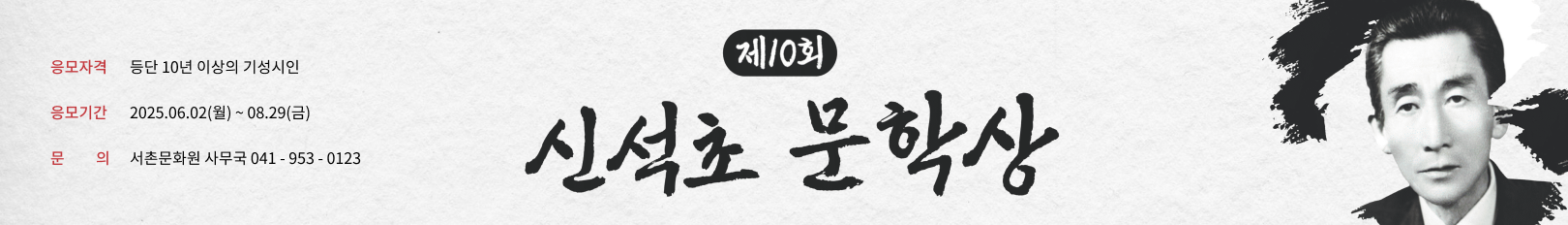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95
0
사람도 자연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연인이다.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산과 들에서 자연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많았다.
지금처럼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도 없었다.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잡초와 야생화, 그리고 늘 푸른 소나무, 대나무와 납작한 돌들도 모두 놀이의 대상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강남 갔던 제비가 찾아왔다.
처마 밑에 부지런하게 흙과 보드라운 섬유질을 물어 나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멋들어진 제비집이 완성되었다.
지난해에 행랑채에 지었던 제비집과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이 올해도 새로운 둥지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설계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비집을 짓는 교육시설도 없다.
제비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하듯이 이웃 마을의 제비집과 똑같은 모양으로 완성시켰다.
여름 한철 둥지에서 살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애써 지은 둥지는 미련 없이 버리고 강남을 찾아 떠나는 제비들을 보면 순환의 질서에 숙연해지기도 한다.
모든 생물에겐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이미 본능적으로 타고 나오는 것 같다.
봄엔 제비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철새는 계절 따라 이동하는 종류가 많다.
텃새라 부르는 참새도 어느 곳에 있다가 찾아오는지 양지바른 논과 밭 주변에 참새들이 많이 모였다.
시골엔 참새들이 많아서 가을 벼농사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래서 참새를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못하도록‘우여, 우여’하며 참새를 멀리 쫓기도 했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한가한 농한기엔 참새 잡기를 하여 구워 먹으면 배고프던 시절에 요긴한 군것질감으로 최고였다.
공중에 날아다닌 새에는 까마귀, 종달새, 비둘기, 제비, 참새, 뻐꾸기, 등 종류가 많으나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공중을 종횡무진으로 날아다니는 종달새와 제비는 아름답게 보였다.
참새는 먹을 것을 찾아 여러 마리가 모여 다니는 습성이 있다.
새들의 노는 모습이나 나는 모습도 단체생활을 하면서 한 마리가 저쪽으로 날아가면 같이 놀던 참새들도 푸드덕하며 모두 날아가 버린다.
강남 갔다가 봄에 찾아오는 제비는 나는 모습도 민첩하고 재빨라서 날아가는 모습이 좌우 회전을 민첩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스럽기도 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 창공에는 많은 새가 날고 있으며, 넓은 푸른 바다에는 많은 바다 생물이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높고 낮은 땅과 산에도 많은 사람과 여러 동물이 함께 먹고 먹히며 살아간다.
공중과 바다.
그리고 육지에서 생활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강자 생존 법칙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드넓은 하늘을 원도 없이 날아다니는 새에는 작은 새로부터 커다란 맹수인 부엉이나 독수리 등 종류도 많다.
사람이 하늘 높이 나는 새를 보면 부러울 때가 많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산천초목은 자연이 만든 예술품일 것이다.
그래서 새처럼 날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비행기이다.
사람이 직접 날아갈 수는 없지만,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여 비행기를 이용하여 새들보다 더 높고 빠르게 날아가며 많은 물품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구촌에는 많은 생물이 먹고 먹히면서 생태환경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것 같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들이 대략 1,000억 마리쯤 산다고 한다.
사람의 숫자보다 16배 정도로 많다.
만약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여러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 조달이 어려웠을 것이다.
지구촌에 생존하는 생물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하지만, 명쾌한 답은 후일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여러 생물 중에서 어느 종은 꼭 있어야 하고, 어느 생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태계의 입장은 모두 필요한 존재다.
사람에겐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며 물고기를 기르는 기술도 있다.
여름 한 철에 노래나 부르며 놀고먹는 베짱이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만약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만 하고 6개월 뒤에 죽는다면 억울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터득한 것 같다.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서 많은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이 TV를 통하여 방영되는 때가 종종 있다.
한가롭게 초원의 풀을 먹다가도 맹수인 호랑이와 사자가 나타나면 혼신의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달음질 친다.
기린이나 캥거루같이 주식으로 풀을 먹는 동물은 이빨이 약하지만, 육식을 좋아하는 사자나 호랑이는 이빨이 날카롭고 강하다.
호랑이와 사자에게 초식동물이 잡히면 한번 물었던 목덜미는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맹수에겐 한 끼 식사가 해결되지만, 희생된 동물에겐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전개된다.
초원에서 사자와 호랑이는 제왕적 존재이고, 강과 바다에선 악어가 왕 노릇을 한다.
하늘 높은 곳에선 맹금류가 무서울 게 없는 존재이다.
독수리, 어웅(바다 독수리), 담아호스(매 종류)가 무서울 게 없이 왕 노릇을 하는 새이다.
생태환경을 위해 동물 시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도 맹금류들이 담당한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과 하늘에서 제왕적인 서열을 둔 것도 사람이 사는 사회와 별 차이 없이 동물의 사회도 비슷하게 서열이 있는 것 같다.
인간의 기술은 여러 방면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기술도 계속하여 발전될 것이고 지구촌의 기후환경도 점차 변화된다면 생태계의 환경도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먼 훗날엔 공룡의 사회가 사라지듯이 지구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도 언젠가는 변화되리라 예측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