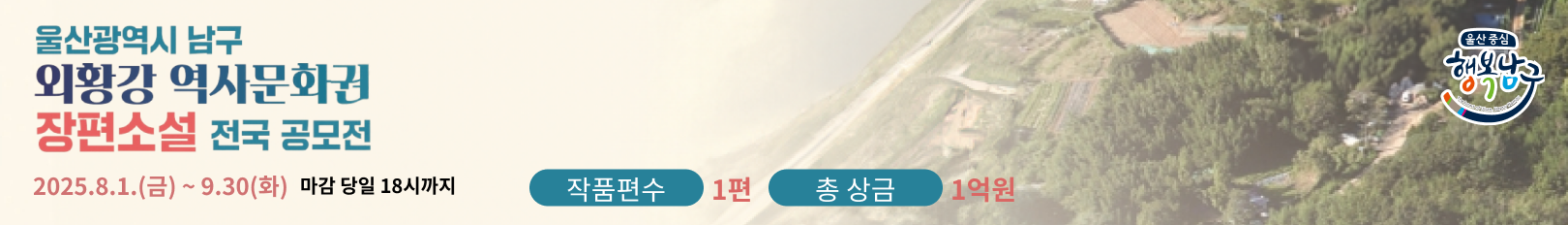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44
0
넝쿨식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담쟁이다.
내가 본 담쟁이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으로는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 회담장 건물을 둘러싼 담쟁이덩굴이다.
내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포츠담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곳이라 관심이 컸었는데 온통 외벽 전체가 담쟁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건물 안에는 미국방(房) 영국방 소련방이 따로 있었고, 당시의 협상 테이블이 그대로 보전되어 감명이 있었다.
호텔로도 이용되는 건물은 이미 3년치까지 예약이 끝났다는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퇴직하고서는 오스트리아 미라벨정원에서 보았던 담쟁이가 기억에 생생하다.
줄거리가 어른 팔뚝보다 굵어 용재(用材)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았다.
덩치의 굵기가 처음 보는 크기여서 담쟁이도 저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정원은 서구에서도 이름난 정원인 데다가 때마침 현지인의 결혼식 행렬이 있었기에 더욱 잊혀지지 않는다.
가까이로는 내가 사는 아파트 입구 옹벽을 덮은 담쟁이벽이다.
일부러 대구의 청라언덕을 가지 않아도 청라(靑蘿)의 추억에 젖어볼 수 있는 장관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푸르름을 주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었다가, 떨겨 탓인지 잎몸이 떨어져 나간 잎자루 또한 한동안 가관을 이룬다.
넝쿨식물의 대표주자로는 칡(葛)과 등(藤)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다.
칡은 산에서, 등나무는 주로 동네 그늘막에서 한몫을 한다.
칡은 암칡과 수칡이 있어 씹을수록 가루가 되는 암칡을 칡즙이나 주전부리로 먹는다.
칡으로 허기를 채우다 보면 온통 입 주위가 시커멓게 변했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상태를 말하고, 만연(蔓延)은 넝쿨이 서서히 번져 어느덧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이른다.
시골집 밭 가, 돌 너드랑에서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칡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식물이 빚는 사활 현장도 인간 세계 못잖음을 보았다.
칡꽃도 그렇거니와 등나무의 늘어진 자색 꽃은 모양이나 향기가 좋다.
넝쿨식물은 계절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
어릴 때 시골집 담장에는 봄이면 인동초가 생기를 찾고, 여름이면 줄장미가 꽃을 피웠고, 가을이면 호박과 수세미가 주렁주렁 열려 풍성함을 가져다주었다.
겨울에는 겨울 나름의 넝쿨들이 담장과 보호색을 띄며 운치를 더하고 있었으니 넝쿨은 장소와 계절이 따로 없었다.
담장을 타고 번지는 줄장미는 가시가 있어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조롱박이나 하눌타리 수세미 여주는 ‘나 여기 있소’하는 양,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린 모습이 볼만하다.
세대가 바뀌니 외래종 넝쿨식물이 들어와 온 산 온 들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가시박 넝쿨은 하천변을 뒤덮고 있고, 환삼 넝쿨은 밭둑은 물론 오가는 길가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외래종은 번식력이 강해서 토종의 자취를 사라지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넝쿨식물들이다.
넝쿨식물은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작물에 감기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인데, 산야는 물론 텃밭 등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
넝쿨식물은 호박이나 하눌타리같이 덩굴손을 가지고 있거나 담쟁이처럼 빨판을 가진 것도 있고 능소화같이 공기 뿌리를 가진 것도 있다.
덩굴장미처럼 다른 것에 기대기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칡이나 담쟁이 넝쿨같이 다른 식물을 괴롭히는 종류도 있다.
기록에 보면 넝쿨이 지거나 다른 식물을 감고 가는 줄기는 태생적으로 왼쪽 감기와 오른쪽 감기가 있다.
칡 덩굴은 시계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오른쪽 감기인 반면, 등(藤) 덩굴의 줄기는 칡과는 반대로 시계 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왼쪽 감기이다.
그밖에 오른쪽 감기 식물로는 나팔꽃 메꽃이 있고 왼쪽 감기로는 인동 덩쿨 박주가리가 있으며, 더덕이나 환삼 덩굴은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양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한다.
넝쿨은 생명력이 강하다.
등뼈도 기둥도 없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서 살아남는다.
끊임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끝도 없이 뻗어간다.
어디든 기어오르려 하고 더 높이 더 단단하게 높은 곳을 향한다.
우리네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고 더불어 산다.
때로는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주고 꽃을 피워 향기를 주며 뿌리를 내어주어 자연이나 인간에게 베푼다.
상대를 감싸주기도 하고 정복하려는 것이 넝쿨이다.
물론 넝쿨져 좋은 것도 있고 넝쿨이 있어 진저리가 나는 것도 있다.
‘넝쿨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떠나게 될 거야.’
오 헨리의 단편소설「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인공 존시는 창밖의 담쟁이덩굴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삶을 비관하였다.
그런 어느 날 밤새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졌는데도 다음날 창문 밖에는 그 잎사귀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지.
넝쿨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난 대목이다.
또 이런 시도 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같이 누리리라.’
이리저리 얽혀져 살아가듯이 함께 어울려, 조선 고려 따질 것 없이 둥글둥글 얽혀 편안히 살자고 이방원이 정몽주의 속을 떠보며 지은 노래다.
이방원의「하여가(何如歌)」는 정몽주의「단심가(丹心歌)」로 노래로만 끝났지만, 인생을 넝쿨처럼 어우렁 더우렁 뒤엉켜 살아가 봄도 무난할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