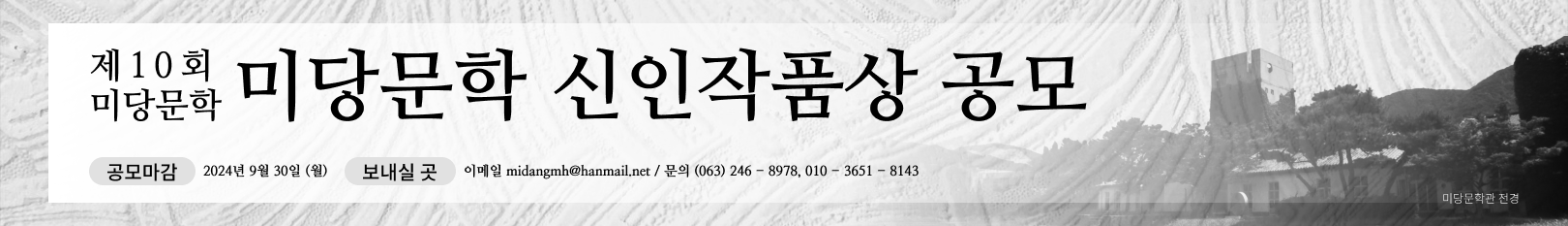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3월 673호
126
0
임고서원(臨皐書院)으로 가는 길은 임고파출소를 지나 임고삼거리에 다다른다.
화강암으로 새겨진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라는 비석, 이곳이 특별한 곳임을 알려준다.
임고삼거리 좌측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물관이 있고, 포은 선생의 유물관을 지나면 조옹대를 볼 수 있다.
조옹대에 오르면 가지런하게 자리 잡은 임고서원이 시야에 들어온다.
구 서원은 왼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새롭게 지어진 서원을 볼 수 있다.
조그마한 산 정상에 세워진 조옹대의 현판은 무괴정(無愧亭)이다.
일생 동안 부끄럼 없는 삶을 지향한 무괴정, 선생의 본관은 연일 정씨이고, 이름은 몽주이며, 호는 포은이다.
이곳의 임고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유학자인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사액서원이고, 경상북도 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서원 내에는 포은유물관, 조옹대, 선죽교, 충효문화수련원 등의 건물이 있고, 특히 임고서원 내 은행나무는 보면 볼수록 우뚝 솟아 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은행나무,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서원을 이곳으로 재건할 때 부래산에 있었던 나무를 함께 옮겨 심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나이는 약 500년 정도,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인다.
샛노란 빛을 띤 은행나무는 높이 약 30m, 가슴 높이의 둘레 5.95m, 수관 폭은 동서 방향으로 약 22m, 남북 방향으로 약 21m에 정도 되는 노거수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은행나무 사이에서 우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서글프기만 하다.
이런들 엇떠하리 저런들 엇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엇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 년까지 누리리라
조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은 포은 선생에게 조선 개국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
「하여가」라고도 하며 “고려 왕조면 어떻고, 새 왕조면 어떻습니까?
만수산 드렁 칡이 같이 얽혀서 오랫동안 함께 누려 봅시다”라고 한 시조가 아닌가!
조선 건국에 함께할 것을 권유한 시조, 그렇지만 포은 선생은 단번에 거절하고「단심가」로 화답을 한다.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잊으랴
가을 하늘은 높은데 매미 소리 아직도 요란하다.
떠나지 않은 여름 손님 때문인지 가을 손님인 귀뚜라미 소리는 기척도 없다.
“이 몸이 죽고 다시 또 죽어 백번을 죽는다 한들 내 마음은 변할 수 없고, 또한 백골이 흙속의 티가 되어 넋이나마 없을지라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바꿀 수는 없다”는 포은 선생의 시조, 이 시조는 반복법을 써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시조가 아닌가!
인간의 삶은 고작 100년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의 은행나무는 500년을 넘게 살았고, 아직도 생생한 느낌을 준다.
수형이 예뻐서 그럴까?
비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충신으로 만들었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간직한 선죽교는 본래 개성에 있었다.
이곳의 선죽교는 개성에 있는 선죽교를 모방하여 세워진 교각, 교각 저편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에서 매미는 처량하게도 울고 있다.
15일이나 20일을 살기 위해 6년이나 17년을 땅속에서 버틴 것은 오늘의 저 울음소리를 내기 위해 그토록 기다렸던가?
매미의 울음소리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숨 쉬는 저 은행나무와 수평과 수직으로 뻗어 나간 굽이진 지난 역사를 볼 수 있게 한다.
해 질 녘 노을은 아름답고 황홀하지만 아련하게 들리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너무도 가슴 아프게 한다.
노래하는 매미는 엄마 매미이고, 아버지 매미는 벙어리이다.
오늘따라 엄마 매미는 왜 저렇게 구슬프게 울어댈까?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니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조는「백로가」라고 하는데, 포은 정몽주 선생의 어머니가 정적이었던 태조 이성계에게 문병을 가려는 아들에게 가지 말라고 당부한 시조이다.
팔순의 노모가 간밤의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문밖까지 따라 나와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포은 선생은 결국 노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문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태종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된 것이 아닌가.
그 후 선죽교 옆에 노모의 비석은 세워졌고, 그 비석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곳에도 이곳과 같이 사시사철 철새들은 날아들고 쓸쓸한 바람은 불었으리라!
시대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기억에서도 가물가물 멀어져 가지만, 이곳 은행나무는 그 하나하나의 역사를 자신의 나이테에 꼼꼼히 새겨 놓는다.
샛노랗게 물들어 가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깊은 사색에 잠긴다.
이러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은 멈춘 것 같고, 나무의 몸통과 가지에 스며든 이끼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 수세기 지난 슬픈 역사도 노을의 고요한 빛에 둘러싸여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