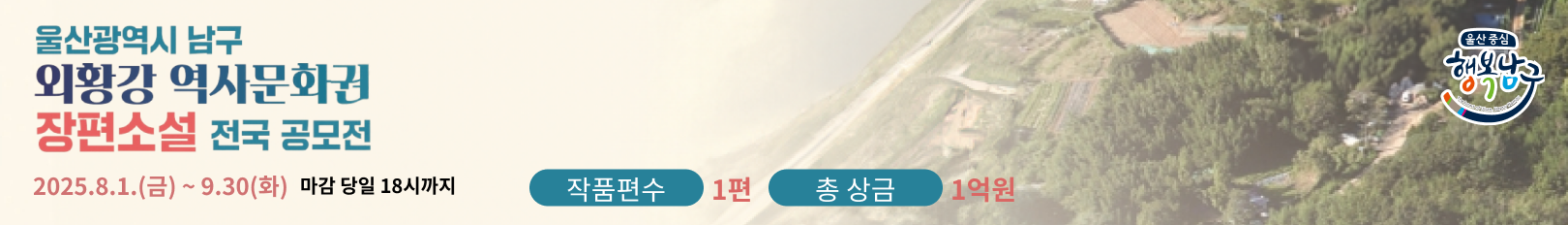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4월 674호
109
0
눈이 내린다. 하얀 눈발이 선운사의 지붕과 마당을 덮고, 탑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는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온몸을 감싼다. 눈은 쉼 없이 낮게, 천천히 내린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사려 깊은 손길로 세상을 감싸주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 나 자신도 한 조각으로 스며드는 느낌에 조용히 숨을 고른다.
선운사의 뒤뜰로 향했다. 아직 겨울의 품안에 잠든 동백숲이 내 앞에 펼쳐졌다. 작고 단단한 꽃망울들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봄을 기다리는 생명이 담겨 있을 것이다. 푸른 잎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빛을 반사한다. 그 눈부신 풍경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나뭇잎에 고이는 눈빛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은 듯 맑고 고요했다.
동백숲 앞에 서니 서정주 시인의 시에 담긴 동백꽃이 떠올랐다. 그의 시 속에서 동백은 붉고 뜨겁게 피어나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다. 나는 눈 속에 감춰진 동백꽃을 떠올리며 아직 오지 않은 3월의 봄을 상상했다. 눈이 녹고 나면, 이곳 동백숲은 다시 붉은 꽃으로 물들겠지. 그때는 이 눈 내린 겨울날을 기억하며 다른 감정으로 이 숲을 바라볼지도 모른다.
숲에서 나와 탑 앞에 섰다. 눈발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눈을 감은 그들의 모습에서 숙연함이 느껴졌다. 또 다른 이들은 천천히 탑을 돌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눈을 맞으며, 말없이 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예배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들의 기도와 마음의 울림이 눈발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닿는 듯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쌓인다. 선운사의 동백숲과 마당, 지붕과 탑이 점점 두터운 하얀 옷을 입어간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시작이 숨 쉬고 있다. 아직 피지 않은 동백꽃은 봄을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하고 있고, 눈에 덮인 탑과 마당도 언젠가 눈이 녹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겨울은 마치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선운사의 겨울은 단순히 계절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고, 가리고, 멈추게 하면서도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품고 있다. 이곳에 서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정화하는 동시에, 나의 내면까지도 정리해 주었다.
오랜 시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내 마음속에 남은 흔적들을 떠올려 보았다.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 무언가를 놓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선운사에서 맞이한 겨울의 하루는 내게 멈추는 법을, 그리고 고요 속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가르쳐 주었다.
눈은 내리고, 쌓이고, 그리고 녹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선운사에서의 풍경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저 하얀 겨울날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마다 떠오르는 조용한 위안으로 남을 것 같다.
선운사에 눈이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