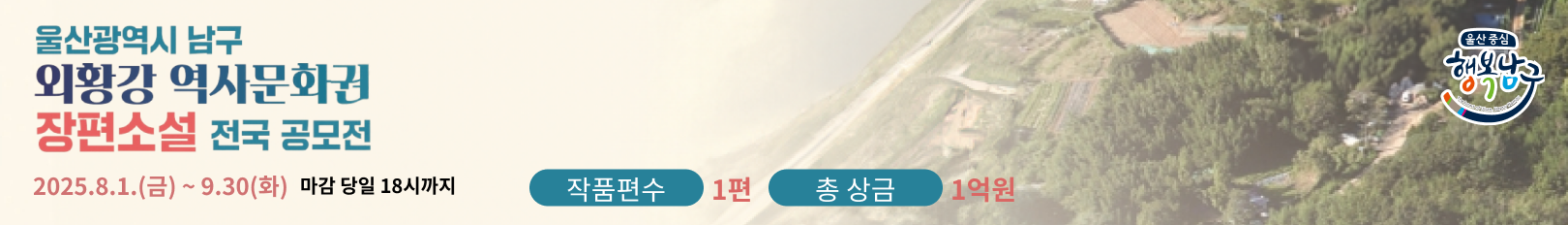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1월 671호
114
0
고래 낙하(落下), Whale fall.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고래. 죽은 뒤 물에 떠오른 고래는 가장 먼저 각종 바닷새와 상어에게 뜯긴다. 수십 일이 지난 뒤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 먹장어와 해삼, 게, 불가사리 등에게 남은 살이 뜯긴다. 대양의 가장 밑바닥에 닿아 벌레에게 뼛속 지방까지 내어준다.
살아서 새끼에게 극진했던 고래는 그렇게 이백 종이 넘는 생명체의 몸이 된다. 백 년을 산 고래는 죽어서 살을 내주고 뼈가 파이는데 백 년이 걸린다. 고래의 무게는 시간의 무게다.
주위의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된 자리에 높고 반짝이는 새 건물이 들어서는 동안, 가만히 있어도 키가 작아지고 있는 사 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사람도 물건도 바뀌지 않는 작은 병원 물리치료실, 누군가 먼저 누웠다 갔을 낡은 침대 위에서 톡, 톡, 전기음을 듣는다.
사는 게 귀찮아.
칸막이 너머로 가래 끓는 소리, 일주일에 한번 눈 감고 만난다. 잿빛으로 버석이는, 쉰, 겹겹의 저음(低音). 말 들어주는 이 없어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 온다는 노인의 고막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다. 조금씩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기능이 멈췄단다. 노인의 삶의 궤적이 만만치 않다 했다. 팔십 년 생이라면 순탄한 삶 몇이나 될까 마는 무슨 일을 얼마나, 궁금증이 일면서도 당사자가 아닌 이에게 듣는 것이 마음 불편해 묻지 않았다. 눈 동그랗게 뜨고 입 모양 크게 만들어 고개 끄덕이고 있을 오랜 인연 물리치료사를 위해 냉동 떡을 가져오고 요구르트를 사 온다.
부스럭거리며 옷섶을 여민 노인이 비척비척 머리맡을 지난다. 느리게 끌리어가는 바닥. 덜컹거리는 병원 문 열고 나가 한 발 한 발 옆으로 내려디딜 계단이 스물한 개다. 일 층 약국 앞 무심히 놓인 보행기는 벽 짚고 다가오는 주인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게다. 10차선 도로의 시끄러운 경적도, 눈앞에서 “싸요, 싸∼” 외치는 과일가게 점원들의 호객 소리도 노인에게는 닿지 않는다. 왁자한 시장 파도 저어가듯 느리게 가는 길. 바닷길 갈라지듯 사람들은 비켜설 것이다.
시장 골목 뒤에 산다 했다. ‘꿀호떡집’과 ‘형제수산’ 앞에서 몸을 틀까. ‘낙원떡’ ‘오복떡’ ‘빵이가득한집’을 지나 ‘사거리청과’ 혹은 ‘충청방앗간’ 앞에서 달각거리는 보행기를 돌릴까. 좀 더 걸어 ‘공주닭집’과 ‘승희네반찬가게’까지 갈까. 칠 벗겨진 지 오래인 철제 대문, 색 바랜 벽지와 장판에 비듬처럼 떨어져 있을 혼잣말들, 마른 걸레 그릇 손등으로 밀쳐놓고 문턱에 주저앉아 엉덩이 밀고 들어갈 눅눅한 고요. 텔레비전 소리 왕왕 울리는 적막 속에 노인은 누울 것이다. 해저의 고래처럼. 나는 그 옆에 누워 있다.
소꿉친구는 스스로 소리의 문을 닫았다.
검었던 머리의 그녀가 새치가 돋아나는 중년이 되는 동안 잃은 건 소리만이 아니었다. 한 남자와 두 번 결혼했고 두 번 이혼했다. 그 남자로 인해 두 번 죽으려 했다. 바람에 씹히고 햇살에 긁힌 세월. 반복되는 배신에 패대기쳐지면서도 버텼다. 끝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길가 미닫이문을 열면 부엌이었다. 그녀가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안쪽에 또 다른 미닫이문 방 하나가 있었다. 어린 어미의 얼굴처럼 작고 오목조목한 눈, 코, 입, 발간 갓난아기가 이불 속에서 꼼질거리고 있었다. 터벅터벅 걸어 나오다 돌아보니 그녀가 골목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친정에도 얘기하지 못했다 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화가 치밀었다. 그녀에게도, 남자에게도, 낡고 오래된 점방 같은 그 작은 방에도.
먼 아랫녘, 봄이면 철쭉꽃 물감처럼 번져 오르는 큰 산 아래 시댁이 있었다. 혼인신고를 해준 시어머니의 성화에 뒤늦게 올린 결혼식, 시골 예식장 계단 구석에서 남자의 강퍅한 등을 보았다. 다가올 시간에 대한 예견이었을까. 남자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몇 년 후 약을 먹었다고 했다. 시골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 했다. 득달같이 달려간 언니와 오빠가 데리고 올라와 큰 병원에 입원시켰고 목숨은 건졌으나 들어오는 소리를 잃었다 했다.
친정에 머물던 얼마 후,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어렸다. 남자가 지방의 일터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들을 키운다 했다. 넷 다 성격이 다른데 잘 자란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좋아했다. 십자수를 놓는다 했다. 이제 겪을 것 다 겪고 잔잔해졌구나, 했다.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던지 메일로 안부를 묻는 내게 세상의 문을 열어주어 고맙다 했다. 다시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에게 근황을 물으니, 고개를 저었다. 한번 결정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녀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외떨어져 새끼들과 함께 먼 바다에 있었다. 얼마 후 다시 약을 먹었다고 했다. 연락하지 못했다. 그녀를 만나려 할 때마다 심연(深淵) 앞에 섰다. 그녀가 가 닿은 심연. 그 깊고 어두운 곳.
노인이 눈을 뜬다. 이울어가는 햇살 움켜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등을 세워 물을 뚫고 푸른 하늘로 오르는 고래. 싱크대 짚고 굽은 손가락 쌀을 씻어 밥을 안 친다. 아들이 돌아올 시간. 고래의 비상(飛上)과 낙하는 하나다.